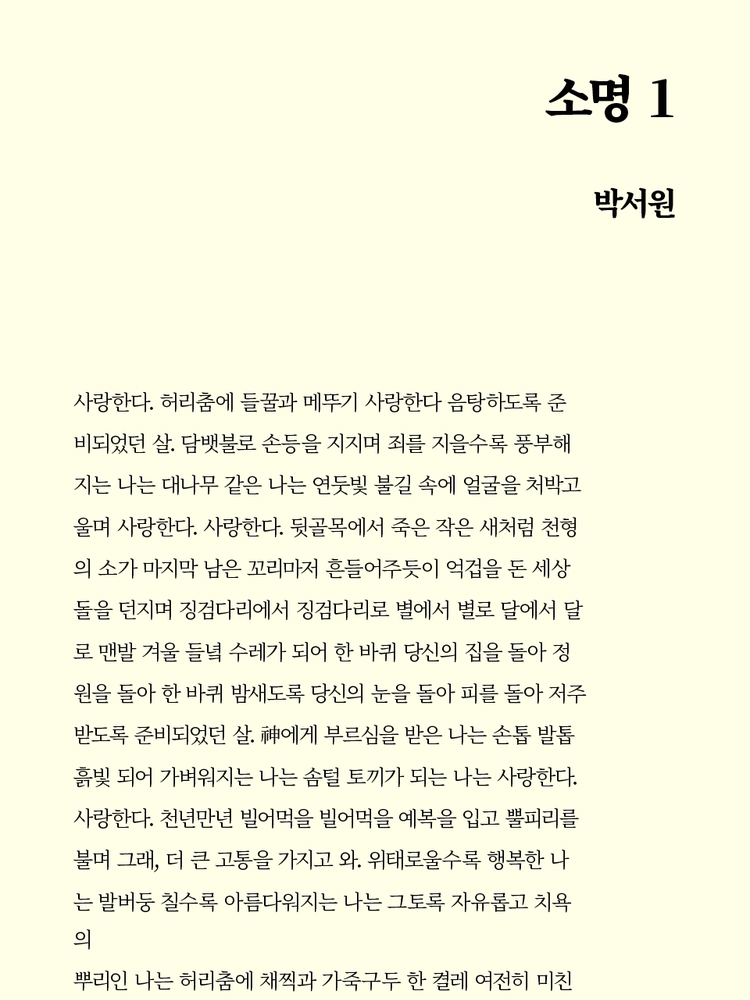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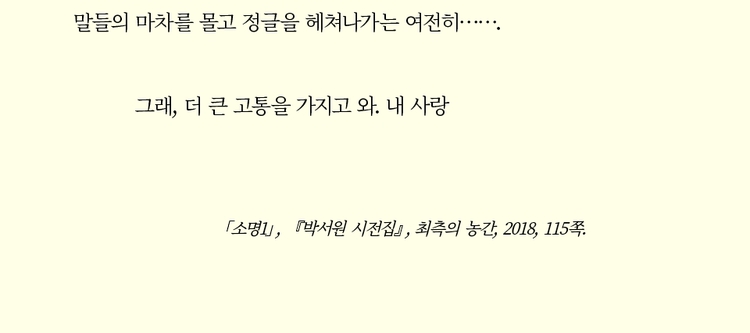
시인 박서원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89년 그는 잡지 『문학정신』에 「학대증」 외 7편의 시를 발표하며 문단에 등장한다. 이후 총 5권의 시집, 『아무도 없어요』(1990), 『난간위의 고양이』(1995), 『이 완벽한 세계』(1997), 『내 기억속의 빈 마음으로 사랑하는 당신』(1998), 『모두 깨어있는 밤』(2002)을 차례로 출간한다. 그런데 다섯 번째 시집의 출간 이후 그는 문단에서 자취를 감춘다. 긴 시간이 흐른 뒤인 2016년, 문단에는 그가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통하여, 박서원이 2012년 5월 16일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음이 알려진다. 이후 2018년, 출판사 최측의농간은 박서원의 시편들을 정리하여 <박서원 시전집>을 발간하게 된다.
박서원은 두 권의 에세이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들을 고백한 바 있다. 아버지의 죽음, 가족과 떨어져 가난과 외로움 속에 보냈던 어린 시절, 성폭행 사건과 그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 된 것,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기면증의 발발, 불륜이라 불리던 교수와의 사랑, 그리고 투병 생활. 시인이자 평론가인 김승희는 박서원의 삶이란 가부장제 사회 속 여성이라는, 하나의 비극적 상징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박서원의 삶은 하나의 눈물겨운 상징이다. 그의 삶은, 한국이라는 아주 특수한 가부장 문화를 가진 땅에서 가진 것 없이 태어난 한 아름답고 재능있는 여성이 겪어야 하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뭉뚱그려 가지고 있는 샘플이다.”(김승희, 2007)
박서원은 따로 시를 배운 적이 없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1인칭 고백의 문체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지독한 삶의 경험들을 고백 나아가 폭로했던 문장들이 자연히 시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삶을 아는 것은 그의 시를 읽기 위한 한 방편이 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 역시 그의 생애사를 바탕으로 그의 시를 해석해내고 있다. 한국 시단에서 박서원의 시는 90년대 여성주의적 문학의 깊이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때 여성주의적(feministic) 문학이란 여성적인(feminine) 문학과 변별되는 것으로, 가부장적인 남성 질서에 의해 억압되었던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낸 작품들을 말한다. 한국 시사에서 고정희, 김승희, 최승자, 김혜순, 김정란 등의 작품이 여성주의적 문학으로 평가받는다. 여성주의적 문학의 계보에 있어, 박서원의 시는 무의식을 언어의 세계로 끌어들여 억압된 욕망의 위장된 성취를 쓴 것(김승희, 1999)이며 여성의 몸 혹은 무의식의 발견으로 출렁이는 해체와 전복의 문체를 가진 것(김정란, 1993)이라고 평가받는다.
여성주의 문학의 이정표
다음의 두 편의 글에서 박서원 시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먼저 2017년 5월 발간된 경향신문의 <박서원 시인 2012년 쓸쓸한 죽음… 문인들 아무도 몰랐다>(심혜리 기자)에서 시인이 죽음을 맞이했을 당시의 정황과 시인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시인의 장례는 수목장으로 치러졌다. 어머니는 경기도 양동면에 있는 한 추모원의 아름드리 나무 아래 딸을 묻었다."
“박서원 시인은 여성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자전적 문학을 통해 1990년대 한국 여성문학의 새 이정표를 썼다.”
또한 작년에 발간된 <박서원 시전집>의 끝에 실린 평론가 황현산의 글에서 생전 시인에 대한 인상과 그의 삶이 어떻게 시로 연결되었는지를 읽을 수 있다. 이 글에서 황현산은 박서원을 불리한 삶의 여건들을 새로운 재산으로 바꾼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시집 『난간위의 고양이』(1995)와 『이 완벽한 세계』(1997)는 한국어가 답사했던 가장 어둡고 가장 황홀했던 길의 기록으로 기억되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어느 날 시인 김정란이 원고 한 뭉치를 들고 와 내게 보여주었다. 그 원고 뭉치의 처음 몇 장을 넘기면서 나는 “꽃들이 피를 흘리며 만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에 박서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문단에 흘러 들어왔다. 죽음의 자세한 정황도 시기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고결한 재능을 뽐냈던 그의 시집 두 권을 편집했던 사람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

박서원은 고통을 드러내어 보이며 시세계를 만들었다. 그는 자신을 망가뜨린 이 세계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첫 번째 시집에 실린 작품 「엄마, 애비 없는 아이를 낳고 싶어」에서, 그는 “엄마, 애비 없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반복적으로 서술한다.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그는 어릴 때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한 몸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술의 반복은 자신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것이며 그로부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과 남성 중심의 질서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애비 없는 아이’를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가 부정하고 혐오하는 존재를 잉태하고 출산함으로써 이 세계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고통을 씨앗으로 삼아
문제는 이렇게 시세계를 만드는 과정이 시인 자신에게도 다시금 상처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세계에 상처받은 자신을 드러내며, 이 세계가 진실되기 보다는 거짓된 것이며 평화로운 곳이라기 보다는 갈등과 싸움으로 점철된 곳임을 들추어낸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자신을 그 고통을 중심으로 정체화하게 된다. 그는 자신을 이 세계에 심어진 ‘경멸’, 하늘 아래 ‘망가진 인형’이라고 인식한다. 그리고 고통스런 신음을 흘리며 저주받은 자신을 이 세계에 심고자 한다.
이처럼 고통으로 자신을 정체화 한 존재가 이 세계의 자신의 존재를 심고자 하는 삶에의 욕망을 보일 때, 이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어두워지면 한껏 타오르는 난로에 양은 주전자 가득 물을/끓이고 마약보다 화려하게 가랑이를 벌리고 악을 쓰며 애비/없는 아이 하나 낳아 보이겠어 (중략) 살 껍질을 벗기고 뼈를 갈구며/병든 밭을 일구는/커다랗게 커다랗게 탄생하는 붉은 혀의 아이를”(19쪽)
결국 박서원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 이 세계에 심고자 했던 ‘애비 없는 아이’란 자신을 의미했던 것이다.
박서원이 고통의 현시를 통해 세계를 파멸시킬 뿐 아니라 자신도 파멸해갈 때, 그의 작품은 세계를 파멸시키고 있다는 희열과 자신이 파멸된 존재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절망과 허무로 파도 치게 된다. 두 번째 시집에 실린 작품 「소명1」에서는 그가 저주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음이 드러난다. 늘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 저주받은 살을 지니고 있다는 느낌, 더 위태로워지고 더 발버둥치면서만이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느낌, 지금 느끼는 경멸과 치욕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는 느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느낌. 이러한 느낌들로 시는 채워지고 있다.
“나는 사랑한다./사랑한다. 천년만년 빌어먹을 빌어먹을 예복을 입고 뿔피리를/불며 그래,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와. 위태로울수록 행복한 나/는 발버둥 칠수록 아름다워지는 나는 그토록 자유롭고 치욕의/뿌리인 나는 허리춤에 채찍과 가죽구두 한 켤레 여전히 미친/말들의 마차를 몰고 정글을 헤쳐나가는 여전히…….”
작품 「소명1」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랑한다.’는 시구는,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러 명확히 그 뜻을 밝히며 박서원의 시세계를 함축해내고 있다. “그래,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와. 내 사랑”
고통 이후의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고통으로 자신의 존재를 정체화 하는 것, 고통을 현시하는 일을 통해 이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심고 삶을 욕망하는 것. 물론 기존의 연구들이 주장하고 있듯, 박서원은 분명 기존의 언어(질서)가 해석 불가능한 방식으로 여성 주체의 힘을 드러낸 시인이다. 그러나 한국 시사에서 그의 존재와 시가 남긴 의의와 가치만을 생각하기에, 박서원의 시를 읽는 일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저주에 가까운 문장들을 쓰면서 그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만 세계에 목소리를 내면서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박서원을 통해 가부장적 세계에서 여성은 고통의 둘레 안에서만 목소리를 내고 존재를 심을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은 여성도 그로 인해 고통에 침몰된 여성도 다시 삶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문학은 고통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 세계에 틈을 내는 일 뿐 아니라, 고통 이후의 삶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 또한 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고통받은 여성은 문학을 통해 다시 삶으로 갈 수 있을까, 이어지는 글에서 박서원의 유산을 물려 받은 여성 시인 김소연의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