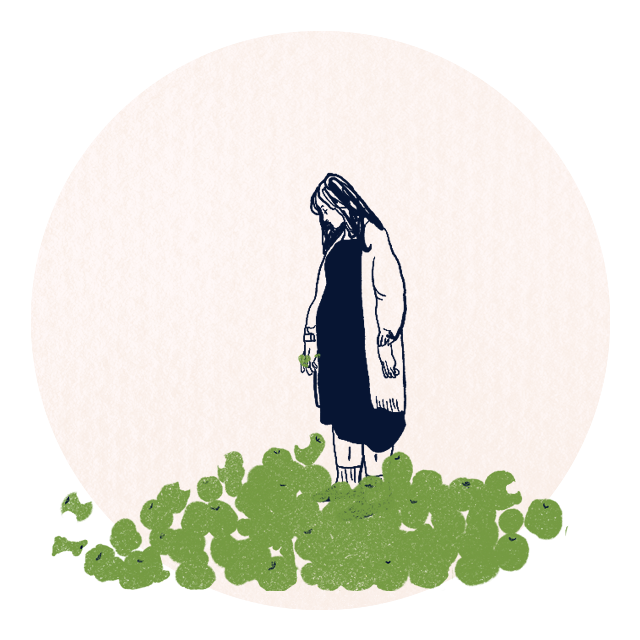다시, 실비아 플라스예요. 번역 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작품들은 시적 구성과 비유, 사유의 흐름이 워낙 단단해서 여러 번 들여다봐도 매료되지 않을 수 없죠. 여성 억압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후기 시의 경우가 특히 그렇고요. 이번에 소개할 시는 <은유>라는 짧은 작품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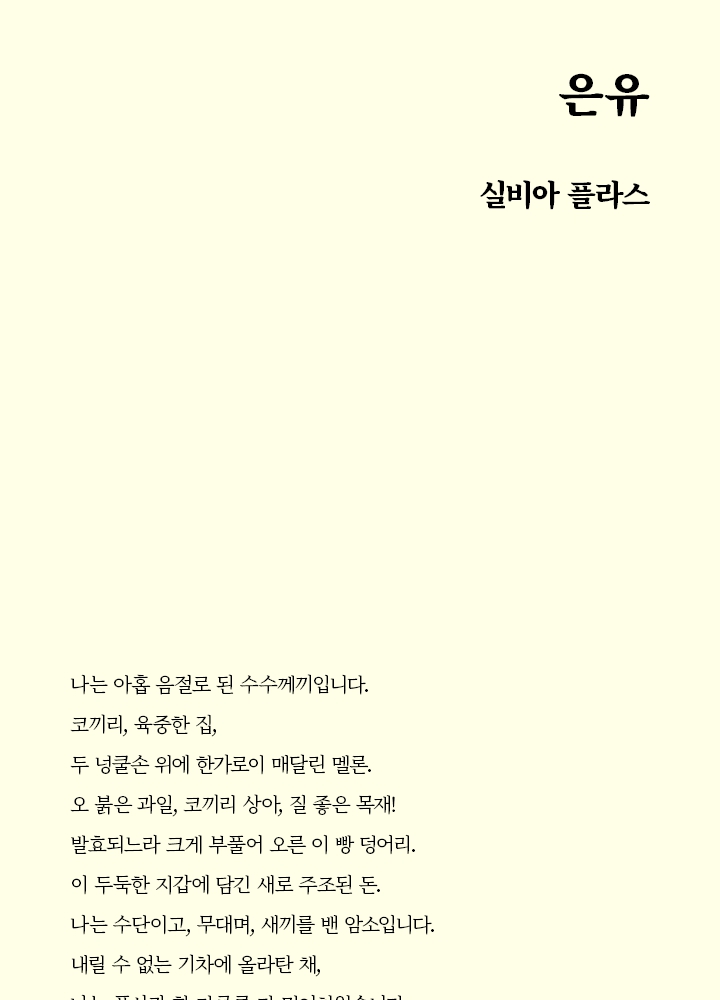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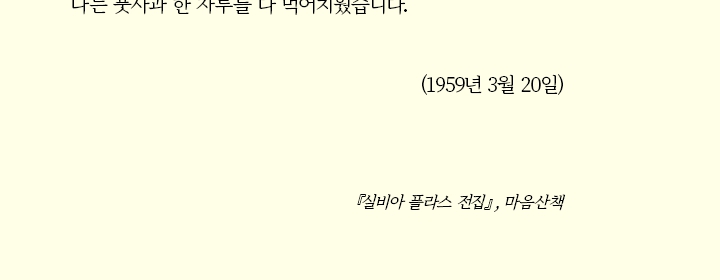
첫 행부터 살펴볼게요. ‘나’를 아홉 음절로 된 수수께끼라 이야기하는군요. 여기의 '아홉 음절'에 해당하는 원문의 표현은 nine syllables로서, 번역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시에서의 ‘음절’은 음절의 원 뜻으로 파악하기보단 수수께끼 속의 수수께끼로 봐야 할 듯 싶어요. 살짝 비틀어 놓은 힌트인 셈이죠. 짐작하기로 그것은 아홉 ‘글자letter’로 되어 있는 낱말 같아요. 아홉 음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를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데다, 아래의 은유들을 볼 때 그 수수께끼의 정답은 p.r.e.g.n.a.n.c.y.임에 분명하기 때문이죠. 즉 이 시의 시적 화자가 pregnancy, 임신중이란 이야기죠.
그것이 왜 Pregnancy인지는 이어지는 은유의 사물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코끼리, 육중한 집, 멜론, 붉은 과일, 코끼리 상아, 질 좋은 목재, 빵 덩어리, 새로 주조된 돈, 그리고 새끼를 밴 암소까지... 이 모두가, 덩치가 크고 새 것인, 어떤 중대한 쓰임을 위해 잘 준비돼 있는 것들이에요. 임산부의 몸에 대한 기댓값이 다 들어 있죠. 문득 한국의 지하철 칸마다 마련된 임산부 배려석의 한 문구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 좌석은 미래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입니다’. 여성의 몸이란 그 미래의 주인공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는 말.

사실 이 수수께끼를 맞히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는 ‘새끼를 밴 암소’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된 건 잘못이에요. 원문 표기는 'cow in calf'. 즉, ‘암소를 밴 새끼’입니다. 실비아 플라스가 도치 구문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새끼를 밴 암소’보다 ‘암소를 밴 새끼’라는 표현이 읽는 이의 시선을 확 잡아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몸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임신한 몸은 흔히 임신을 한 바로 그 사람의 몸 때문이 아니라 뱃속에 든 것을 담고 키우고 지키는 몸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취급되죠. 임신한 여성 또한 그런 보편적 인식을 내면화하면서, 내 몸이 나의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고요. 내 몸은 아이의 것이며 아이만이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것 같죠. ‘암소를 밴 새끼’처럼 아이가 나를 삼킨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의미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앞의 표현들입니다. “나는 수단이고, 무대이며”. 임신한 여성의 몸은 수단이자 도구이고, 무대이자 집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임신하지 않은 여성 또한 잠재적인 ‘수단’과 ‘무대’이긴 하죠. 한국의 ‘가임기 지도’가 그에 대한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요?
임신 그 자체

임신 상태에 대한 비유 안에 스민 날카로운 냉소를 만나며 조금 들떴던 것도 잠시, 마지막 두 행에 가서는 어떤 답답함과 막막함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내릴 수 없는 기차에 올라탄 채,/나는 풋사과 한 자루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여기서도 ‘암소를 밴 새끼’라는 표현과 유사한 도치가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뱃속에 든 아이를 뱃속으로부터 탈락(하차)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가 ‘내릴 수 없는 기차’를 올라탔다고 바꿔 말하니까요.
그리고 ‘나’는 기차에서 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풋사과 한 자루를 다 먹어치우기까지 해요. 신 음식을 찾는 육체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것을 먹으라는 강요에 따르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둘 가운데 어느 쪽이라 해도 내가 '나'의 주체적 '선택'을 통해 먹거나 행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내릴 수 없는 기차에서, 풋사과 한 자루를 다 먹어치우면서 ‘나’는 자꾸만 비대해지겠죠? 내 원래의 몸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겠고요. 결국 ‘나’는 ‘임신한 여성’이 아니라 ‘임신 그 자체’가 되고 말 테고요. 만 9개월의 임신 상태를 끝내고 기차에서 내리고 난 뒤라면 어떨까요? 이 수수께끼의 상태로부터 깨끗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그 ‘수수께끼’란 한 여성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자신의 육체와 함께 살아가는 ‘알 수 없음’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이제 압니다. 시 속의 ‘나’가 아닌 시 바깥의 ‘우리’는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계속 알아야 하고 또 이야기해야 하겠죠. 수수께끼를 수수께끼 상태에 있도록 만든 건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떤 흐름 때문이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