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싸 되는 법’, ‘인싸 개그’, ‘인싸 맛집’……. 최근 어디서나 ‘인싸’라는 말이 대유행이다. 오픈형 국어사전에 의하면, ‘인사이더’의 준말인 ‘인싸’는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 단어에서 ‘주류’로 불리는 이들이 형성하는 흐름, 소위 ‘트렌드’로부터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감지된다면 지나치게 예민한 걸까.
그런데 좀 기이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아싸’, 즉 ‘아웃사이더’가 ‘몰개성한 사회에서 고유의 색깔을 잃지 않고 사는 멋쟁이’라는 낭만화된 의미로 통용됐던 것과 사뭇 대조적이지 않은가. 평균적이고 안전한 삶에 대한 욕망을 은폐한 채 자신이 ‘아싸’임을 주장하던 것이 다소 기만적이었다면, 모두 ‘인싸-되기’에 혈안이 된 최근의 세태는 ‘주변부에서 소수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 축적해온 우리 사회의 성찰을 일거에 삭제하는 듯해 씁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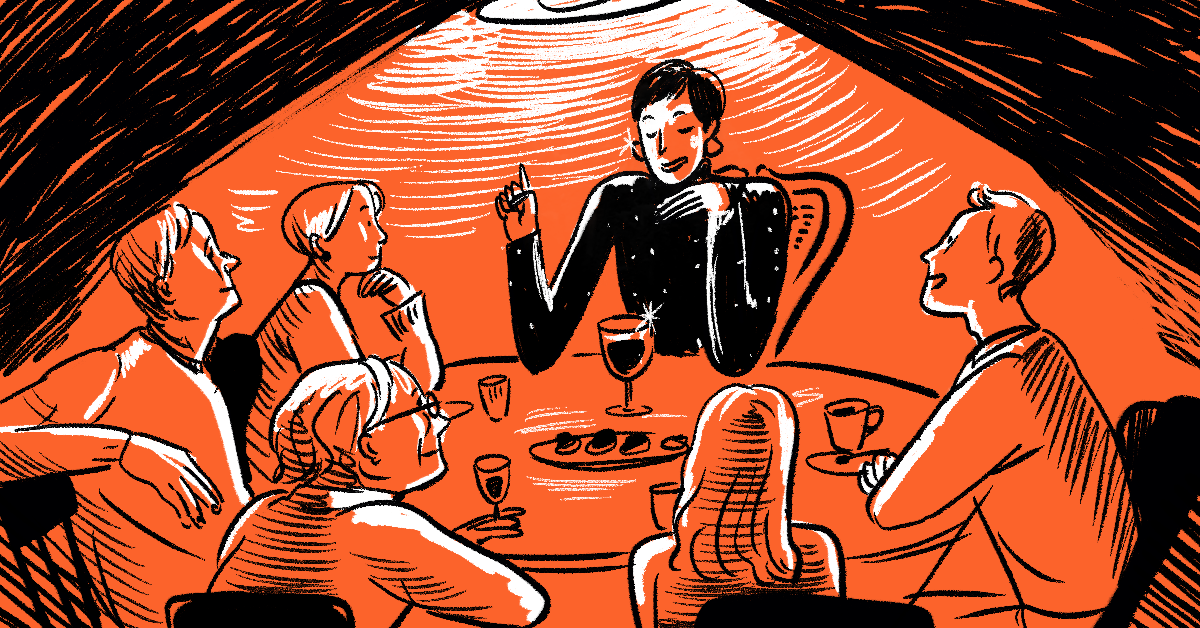
‘아싸’와 ‘인싸’ 모두 ‘중심/주변’이라는 위계화된 이분법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같은 종류의 욕망이겠으나, 후자는 ‘주류/기득권에 속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도 없이 ‘주변부적인 것’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승인한다. 이는 어쩌면 사회가 더 나빠졌다는 신호일까.
문학비평가 헤럴드 블룸은 ‘영향에의 불안(anxiety of influe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후대 작가들은 선배들의 작품이 자신에게 끼칠 영향력을 두려워하기에 정전이나 지배적 규범에 대해 방어적이며, 의도적으로 그것을 오독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흐름을 만들거나 트렌드에 포섭되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오히려 지배적인 영향권 안에 편입되길 적극적으로 바라는 ‘인싸-되기’의 욕망은 ‘영향에의 갈망’ 정도로 이름 붙일 수 있을까.
#2
화장술을 시연해 보이며 화장품을 파는 홈쇼핑 채널이나 요리를 직접 해보이며 레시피를 알려주는 요리프로그램을 볼 때면 독특하게 들리는 어법이 있다. 보조용언 ‘-어 주다’의 활용이다. “스킨을 손바닥에 덜어서 양 볼에 가볍게 펴 발라주세요.” “냄비에 물을 3분의 2 정도 넣어주시고,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째서 ‘펴 바르세요.’ ‘넣으시고’ ‘기다리세요’라고 하지 않고, ‘-해 주세요’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것일까.
보조용언 ‘-어 주다’는 앞 동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말로서 동사 뒤에 쓰인다. ‘밥을 대신 먹어 주다’ ‘(동생에게) 물을 떠 주다’ 같은 식이다. 즉 ‘다른 사람’과 영향관계를 맺을 때 쓰인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므로 ‘-어 주다’의 용법에는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 줄’ 때 발생하는 위계화된 정조들, 이를테면 시혜, 동정, 연민, 인정, 위력, 권력감 등이 쉽게 수반된다.
내가 내 얼굴에 로션을 펴 바를 때, 요리를 위해 냄비에 물을 넣고 기다릴 때, 나는 누구와 어떤 영향관계를 맺을까. 누구와도 영향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 행위를 하는 나 자신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펴 바르세요.’가 아닌 ‘펴 발라주세요’일까. 어쩌면 ‘펴 바르세요’라는 표현이 명령형처럼 들려 화자가 고압적으로 보일 것을 염려한 결과일지 모른다. 한국사회에서 서비스직종의 언어는 고객을 지나치게 격상시키는 과잉 향-상성(pro-the upper classes)을 띤다. 이런 언어현상이 서비스직의 여성화와 맺는 관계를 숙고해볼 일이다.
나는 지금 국어사전이 규정한 어법이 우리 언어생활의 유일한 표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냥 궁금하고 흥미롭다. 내가 나를 위해 하는 행위인데도 마치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그 행위를 하는 양 ‘-어 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서 엿보이는 이 ‘둔감’이. 존재하지 않는 영향관계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정작 존재하는 영향관계를 은폐・왜곡하는 데 쓰일지 모를 이 언어적 착시가.
#3
‘영향에의 갈망’과 ‘-어 주다’의 용법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니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현재 ‘대통령 청원운동’ 홈페이지를 열람하면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라는 표제 하에 ‘-해 주세요.’로 끝나는 수많은 ‘청원’들이 빼곡하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처벌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등 이 페이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권력자로 간주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영향’을 갈망하는 절박한 요청들이다.
그런데 ‘청원(請願)’은 “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ㆍ명령ㆍ규칙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국회ㆍ관공서ㆍ지방 의회 따위에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그저 ‘바라는 바(願)’를 누군가에게 ‘요청(請)’한다는 범박한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법률로 정의된 일종의 ‘제도’라는 뜻이다. 북 두드려 나랏님께 읍소하던 백성 시절의 일과는 다르다.
최근 국민과 “직접 소통”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설치됐다는 이 페이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이 공간이 성폭력 피해자를 옹호한 모 여자 연예인을 사형시켜 달라거나 ‘꼴페미 교육을 멈춰주세요’ 같은 비윤리적・비합리적 ‘원’을 부끄럼 없이 ‘청’하는 장으로 전락했다는 의견,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청와대가 답해준다는 명목 때문에 사회적 논의 대신 다수의 폭력을 유발하는 여론몰이 장이 돼버렸다는 비판 등이 이미 제기됐다.
경청할 만한 지적은 권력자의 ‘영향’을 갈망하는 이 무수한 ‘청’들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판타지만 조장할 뿐 기실 ‘대통령’의 영향력을 과대재현하고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를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상상하게 한다는 비판이다.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영향력 있는 권력자가 뭔가를 ‘해 주길’ 바라는 상상력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공통감각을 바꾸기 위해 공론장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나의 실천이다. 이는 내가 내 볼에 로션을 펴 바르듯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이다. 그건 누군가의 영향력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기도 하다. 언어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언어, 양자의 관계는 필시 긴밀하리라.